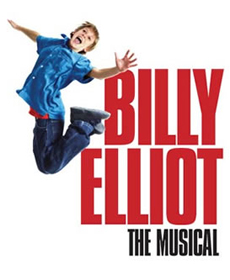조원희, “빌리 아빠 역, 다른 사람 주기 싫어요”
작성일2010.11.23
조회수16,876
 “뮤지컬에서 대박 나고 싶다면 연예인을 잡아요”라는 외침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지금, <빌리 엘리어트>의 성인 배역 캐스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캐스팅에 참여한 해외 스텝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표를 팔기 위함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배우들만을 뽑았다”고 입을 모았고 그 진가는 막이 오름과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무대 위에서 배역을 통해 배우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진정한 스테이지 파워, 빌리 아빠로 활약하고 있는 조원희(46)가 하나의 증거이다.
“뮤지컬에서 대박 나고 싶다면 연예인을 잡아요”라는 외침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지금, <빌리 엘리어트>의 성인 배역 캐스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캐스팅에 참여한 해외 스텝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표를 팔기 위함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배우들만을 뽑았다”고 입을 모았고 그 진가는 막이 오름과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무대 위에서 배역을 통해 배우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진정한 스테이지 파워, 빌리 아빠로 활약하고 있는 조원희(46)가 하나의 증거이다. 어느 순간 내 아들, 내 아버지로
“아빠는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배역이에요. 처음엔 ‘딱 하루만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30회가 넘고 나서는 더욱 작품에 몰입이 되면서 또 다른 호흡선이 느껴지는 거에요. 하루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거 다른 사람 주면 안되겠다,(웃음) 여태까지 해 왔던 공연 보다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빌리 아빠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으며 때론 거칠기까지 하다. 하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깊고, 또 그 마음은 더 넓다. 어느덧 공연 100회를 훌쩍 넘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 아빠 조원희 역시 그런 점에 이끌려 매일 더 배역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리딩 후 첫 리허설을 할 때, 배역이나 스토리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땐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을 잘 선택했구나, 싶었죠. 물론 초반엔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연기를 배우고 거기서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젠 우리 정서가 조금씩 녹아 들고 자릴 잡으면서 관객분들이 더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아들의 재능을 펼쳐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 세계 구분이 없을 듯. “말 없이 그저 빌리를 바라보는 침묵, 그 점점점…에 모든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는, 어느 순간 무대 위 빌리가 정말 자신의 아들로 보이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다.
“톨 보이를 때리고 나서 로열발레스쿨 심사위원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느 순간 빌리와 아빠가 앉아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짝다리로 앉거나. 서로 꾸민 게 아니거든요. 아,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싶어요. 운이 좋다면 오늘도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웃음)
17년간 떠나 있던 뮤지컬, “연기가 고팠다”
조원희의 배우 인생은 뮤지컬 전문극단인 현대극단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연극에 빠져, 당시 국내 굵직한 몇 개의 극단 중 가장 ‘모던해 보이는’ 이름 때문에 현대극단 오디션을 봤다는 그는 “연극은 3, 4년에 한 편 할까, 말까”라는 선배의 말에 몹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오디션 때 느닷없이 노래 해 보라고 해서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불렀어요. 합격했을 땐 대학 붙은 것 보다 더 기뻤는데 들어가 보니 연극은 거의 안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하나, 잠시 갈등했는데 윤복희, 유인촌 등 당시 스타 배우라는 분들이 줄줄이 계신걸 보고, 그대로 눌러 앉았죠.”
현대극단 이후 롯데월드 예술극장에서 활동하며 ‘뮤지컬 오빠 부대’를 이끌기도 했던 그는 <코러스 라인>의 연출가 잭 역을 끝으로 뮤지컬 무대를 뒤로 했다.
“<코러스 라인>도 목소리 때문에 아마 제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웃음), 연기적인 면에 갈증을 느끼던 때라 이 작품도 고사했었죠. 그런데 등장 장면보다 목소리만 나오는 장면이 훨씬 많아서(웃음).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제 목소리를 알리게 된 계기도 되었고 그간 인텔리 아니면 아주 코믹한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중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도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도 드라마가 있는 뮤지컬, 드라마가 살아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배우, 타인의 삶 사는 숙명을 가진 상처받은 영혼
올해 <몬테크리스토>의 파리아 신부 역으로 17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다시 서기 전까지, 그는 연극 <불 좀 꺼주세요> <고등어> <콜렉터> 등과 드라마 ‘아이리스’, ‘카인과 아벨’,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단적비연수’, ‘무영검’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 편의 작품들로 대중들을 만나왔다. 여기에 최근엔 안정감 있는 정겨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성우 및 나레이션 작업이 더해졌다. DSLR 카메라 광고를 비롯, 수 많은 CF와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틀면 조원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창시절 꿈이 DJ이기도 했어요. 신당동 떡볶이집, 이태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DJ를 하기도 했고요. 배우로 무대에만 설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무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목소리만 알고 직업이 성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 역시 연기의 한 부분이고, 최근엔 어떤 나레이션을 하든 소개에 ‘배우 조원희’라고 써 달라고 조건을 걸어요(웃음).”

지난 25년 간 배우의 이름으로 살아온 조원희는 여전히 “세월이 너무 짧아 눈 뜨면 벌써 잔다”며 하소연이 이어진다. “몸치, 박치여서”라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열 번, 스무 번 더 할 수 밖에 없는 연습벌레가 되어야만 했다”는 지나온 시간엔 자부심을 크게 두었다.
“잠깐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배우 나름의 자존심을 안 버리고 잘 이어왔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풍족함이 있었더라면 후배 양성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극단이나 아카데미를 통해 흔해 빠지고 통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후배들을 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가 외국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당연히 공연을 할 수 있도록요.”
그가 생각하는 배우는 ‘상처받은 영혼’이다. 자신이 상처를 입은 만큼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숭고한 행위가 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조원희. 김정란 시인의 ‘나비의 꿈’ 중 ‘금이 간 영혼에게선 좋은 냄새가 난다’는 구절 이야기가 나오자 “맞아,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나지막이 되뇌었다.
글: 황선아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suna1@interpark.com)
사진: 이민옥(okjassi@daum.net), 매지스텔라 제공
[ⓒ플레이DB m.playd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