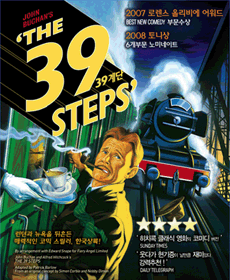<39계단> 연극적 상상력이란 바로 이런 것

연극 <39계단>이 공연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같은 소재(1915년 존 버컨의 동명소설)로 히치콕이 만든 흑백 영화가 큰 인상으로 남은 까닭도 있겠지만, 2006년 런던 초연 이후 현재까지 웨스트엔드에서 한창 공연 중인 이 작품의 빠른 한국 상륙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웨스트엔드의 환호 속에 색다른 형태로 선보이는 이 공연이 과연 한국 관객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달 여의 공연을 이제 막 시작한 지금, ‘독특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에 한 표를 던져본다.
극장식 카바레에 간 주인공 해리는 영국 첩보요원의 살해사건과 얽히며 경찰과 스파이들에게 동시에 쫓긴다. ‘39계단’은 이들 사이의 암호일 수도, 해리가 가야 할 종착지일 수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위험천만한 사건에 얽혀 스파이들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것을 헤쳐 나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치밀한 전개와 스릴이 소설과 영화의 묘미였다면, 연극 <39계단>은 스토리를 무대 위에 형상화 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별나게 신기하거나 현대적인 장치 하나 없는 크지 않은 무대 위에서 해리는 런던, 버릭어폰트위드, 에딘버러, 하일랜드 등 영국 전역으로 질주한다. 보이지 않는 창문 너머 지명이 쓰인 간판이 지나가면,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막 그곳을 지나친 것이다.

단 4명의 배우가 등장하여 140여 가지 배역을 보여준다는 것도 참맛이 난다. 오로지 무대 위에서만 환영 받는 거짓말인 ‘연극적인 약속’들로 재치와 센스가 곳곳에서 샘솟는다. 서너 개의 모자를 바꿔 쓸 때마다 그 사람은 경찰, 행인, 신문팔이, 기차승객이 된다. 사각 프레임을 허공에 들면 그곳에 창문이 생기고, 들어온 문을 밀어 구석에 세우면 거기에 또 문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무대와 객석 사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연극적인 약속들이 극과 현실의 경계를 너무나 티나게 오고간다는 점이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니 배우가 무대 뒤를 향해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리네요”라고 말해 준다거나, 바람에 펄럭이는 코트 자락은 자신이 직접 옷을 잡아 흔들어댄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주-추격하는 인물들은 그림자 인형들이 대신한다. 인형들을 조정하던 사람들의 실루엣이 공개되는 것도 당연.
오해와 이해가 손바닥 뒤집듯 이뤄지는 작품 안에서, 뻔한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면서도 호방하게 웃거나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코믹한 장면을 만드는 인물들이야 말로 웃음의 핵.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다.
하지만 소소히 펼쳐지는 연극적 설정과 인물들이 주고받는 위트 만으로는 <39계단>에 남는 아쉬움이 크다. 영국이라는 배경이 만드는 공감의 극적 묘미는 세계 통용의 대사와 슬랩스틱으로 남았다. 장점과 단점의 원천이 같다는 아이러니함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다른 연극들과 차별되는 극적인 맛이 연극 <39계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완벽하게 연극적으로 탄생된 상상력, 그것이 만드는 불순물 없는 깨끗한 웃음을 소소히 즐겨봐도 괜찮을 것이다.
글: 황선아 기자(인터파크INT suna1@interpark.com)
사진: 다큐멘터리 허브(club.cyworld.com/docuherb)
[ⓒ플레이DB m.playd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