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환

- 출생연도
- 최종학력
- 최근작품

첫번째 관객 연출가는 작품의 첫 번째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관념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게 연극인데, 이런 생각을 던질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제 3의 눈이 필요합니다. 연출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서, 관객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죠. 이를 조율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니, 첫 번째 관객이 되야 합니다.

배우에서 연출로 서울예전 연극과를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가 처음 연기생활부터 시작했어요. 극단 살림살이를 위해 찬조출연 형식으로 오페라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때 연출이 재미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연출 선생님이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왜 외국에서 연출을 데리고 와야할까’하는 의혹을 갖기도 했지요. 지금이야 이런 교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땐 어린 나이에 문화사대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연기 공부를 위해 미국에 가서, 연기자보단 연출 공부에 좀 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연기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마음 한 편에선 연출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 별명이 ‘르네상스 맨’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음향, 작곡, 조명, 연출 등 여러 역할을 혼자서 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 좋은 동지들을 만나 극단 수를 꾸리게 됐고, 2003년 <나생문>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오태석 선생님의 작품들은 대부분 저에게 충격을 건넸어요. 특히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는 여러 번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님의 <인어전설>이란 작품도 대단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정말 훌륭했고, 김구미자 선생님이 눈 앞에서 연기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연출한 작품으로는 <나생문> <심판> <고곤의 선물>를 꼽고 싶습니다. 내가 가야야 할 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고민했던 작품이 <심판>이었고, 난 이런 작품을 해야 하는구나 굳게 결심한 작품이 <고곤의 선물>이었어요. <나생문>은 저의 첫 연극 작품이라 기억에 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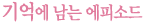
감동의 커튼콜 지난 해 <고곤의 선물> 마지막 공연 커튼콜 때, 400석이 넘는 객석에서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보면서 소름이 돋고, 배우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훌륭한 배우들이 이뤄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동환, 서이숙 선생님 모두 같은 뜻이었어요. 잘 한 번 만들어보자, 극한으로 가서 이만하면 됐어란 말은 절대 하지 말자, 뭔가 더 있을 거야, 항상 이런 자세로 <고곤의 선물>을 만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나생문> 힘들었던 기억도 많아요. <나생문> 첫 공연 당시 관객이 너무 없었어요. 스무 명 관객을 앞에 두고 공연을 하는데 자금 압박도 밀려들어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 당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원형탈모가 심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생문>이 터지더군요. 300석 공연장 앞에 300명의 줄이 서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줄 알았다고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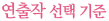
사람이야기 연출가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객이 돈을 내고 보러 오는 게 단순히 재미있는 걸 보는 것을 넘어 예술가가 창조해낸 새로운 시각을 전달받는 걸 원하거든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태환의 색깔, 특징을 잡고자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질문 할 수 있는 가를 보지요. 또 하나는 결국 연극에서만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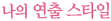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저는 배우들과 이야기 하는 걸 즐깁니다. 일방적인 걸 싫어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신입 단원이 생각해 낼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참여한 게 아니라, 각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극이 잘 되는 것,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빨리 취합하고 선택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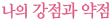
순발력, 그에 따른 실수 강점은 굉장히 빨리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편이라는 것. 그리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수 많은 사항이 결정돼야 하고 진행됩니다. 한 가지에 매달려 시간을 끌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 결정하기도 해요.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챙겨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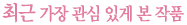
박근형 선생님의 <선착장에서>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연극이 이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었죠.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도 정말 잘 봤지만 <선창장에서>를 보고 존경하게 됐어요. <억울한 여자>에서 배우 이지하, 박윤희씨를 보면서 배우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뮤지컬로는 <캣츠>를 인상깊게 봤습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모두 봤는데, 웨스트엔드 작품이 정말 좋았어요. 배우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극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극단 수가 저 말고 제 2의, 제 3의 구태환이 나오고 이곳이 하나의 장이 돼서 자유롭게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그 길을 닦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하고, 난 어떤 모습으로 연극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 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익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이 직업에는 정년이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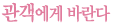
관객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혼자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극이 대중성을 버리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객에서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만해지면 관객은 떠나지요. 지난 8~90년에는 연극에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들 떠났습니다. 지금 대단한 선배 연출가와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서 관객들이 돌아오도록 해야겠죠.
정리: 송지혜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song@interpa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