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숙


텍스트(문학)를 부피감 있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 텍스트를 구체화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을 주게 하고, 공연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연출의 일입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연출가는 본인이 가진 전 동력을 사용해 배우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 당겨야 합니다.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연출가 스스로의 에너지가 충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연출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대학에서 극작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오태석 선생님이 저희 극작반을 6개월 정도 담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 극작을 잘 하기 위해서 연출도 하고 직접 배우로 서보기도 했는데 연기 전공의 배우들이 저보고 자기 것은 못하면서 남 지적을 잘 한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는데도 너는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고 자꾸 그랬대요. 친구들이 너나 잘하라고 저를 한꺼번에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주변에서 연출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그건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듣는 말이겠지요. 아마도 제 내면에 ‘직접 연출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작품이 <더치맨>입니다. 학교에 어슬렁거리던 장두이 씨를 자장면 한 그릇 사주고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마워서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작 피디로 나선 조석준이에요. 그 친구가 연극을 하려고 포목가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제 작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는 제작자나 연출가, 극단 대표의 말로가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작을 하면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가는 신세였으니까요. 지금 같은 지원 제도는 바랄 수도 없을 때죠. 다행히 적자는 나지 않고 포목가게도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대로 공연이 잘된 편이었어요. <더치맨> 올린 삼일로 창고극장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극장입니다. 언제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작품을 올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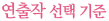
할 수 있는 만큼 26살에 연출가로 데뷔한 후 연극계를 잠시 떠나 있다가 중고 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십 년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상해갔어요. 연극을 안 하면 인생이 어긋날 것 같았지요. 그래서 결국 십 년 만에 돌아오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공연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띄엄띄엄 하다가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 작품 편 수가 많지는 않아요. 시작은 어릴 때 했을지언정 경력은 미천하니, 저에게는 다른 분들이 다 선배들이죠.
자신의 깜냥으로 소화할 만한 작품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으니 전 병이에요. (웃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게 많으니 그게 병이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못해 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유진 오닐 작품들, 오태석 선생님의 <자전거>를 꼭 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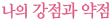
눈을 떼지 못하게 제 작품이 보기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위트, 유머, 센스가 없지요. 제가 뭘 했다고 하면 다들 무섭다고들 합니다. 희극 작품인 <대학살의 신>을 할 때는 배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나에게도 ‘위트, 유머, 센스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작품을 하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모자라니까 그것도 유머가 되더라고요.
작품 안에서 계속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자 결점입니다. 계속되는 긴장감 때문에 피로감도 느낄 수 있지만 장점이라고 들자면 저는 자꾸 감춰진 무엇인가를 들춰내고 싶어하고 먼저 의심을 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작품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고 소심합니다. 그래서 배우들과 작업을 할 때, 부끄럼이 많아 익숙하게 되기 까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저를 다 풀어놓지 않아 생기는 긴장감이 오히려 작품에 힘이 된다고 여겨요.


<단테의 신곡> 이번에 재연을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덤비지 못할 작품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작품이라고 꼽고 싶어요. 준비하는 동안은 힘들어서 언제나 후회막심이지만, 어쨌든 나와 운명적으로 만난 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전 오히려 아쉬워서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짐>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레이디 맥베스>도 버전을 다르게 해서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정리할 것이 많다는 말이기도 한데, 부끄럽게도 자꾸 주섬주섬 떠오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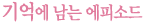
역할을 위해서라면 <유리동물원>때 심완준 씨를 굶기려고 무지 애썼어요. 그가 맡은 톰은 약간 뺀질뺀질 하지만 로라를 들어 올려야 하는 힘도 있어야 했고 한편으로 로라를 이해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는 인물로 그리고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완준은 좀 통통하고 순진해 보이는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밥을 못 먹게 하려고 조연출 둘을 감시로 붙였지요. 혹시 밖에 나가서 실컷 먹고 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어쨌든 두 달 사이에 10kg를 감량해서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어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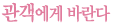
긍정적인 스트레스 저는 관객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가 우리에게 감동과 재미도 주지만, 공연에서 유지하고 있는 긴장감을 통해 관객도 일종의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석에 앉은 관객들도 텍스트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객들과 작품이라는 끈을 양쪽에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작업자로 살다 요 근래 갑자기 전성시대가 온 것처럼 여러 작품을 계속해 왔는데, 다행히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배우와 교류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연출 작업자로 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출 작업자로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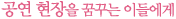
대본을 가까이 연극쟁이로 살다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떠돌다 다시 돌아오는 연극인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만큼 연극은 힘들면서도 만족감을 줍니다. 스스로 내밀하게 다져온 것을 관객에게 내밀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은 상당히 기쁩니다. 인간이 삶을 재연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 머리 속으로 꿈꿔 오던 것을 무대 위에서 실현해 보이는 연극 작업은 그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무대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차곡차곡 연출가로서 커리어를 쌓아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작품과 자신이 홀연히 만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극은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 같지만 그렇게 계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바심내지 말고 부서질 데로 부서져 끝까지 가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절벽 앞에 서 봤을 때 비로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무대를 꿈꾸는 이들은 항상 1차적으로 대본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작품보다는 한 작품을 심도 있게 파고 들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여러 버전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연출가로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강진이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jini21@interpark.com)
사진: 플레이디비 DB,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