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연출가는 무대인 중에서 가장 나중에 생긴 직업이라고 해요. 먼저 배우가 있었고 그 다음엔 작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출가라는 직업이 생긴 거지요. 배우들끼리 연습을 하면 서로 주인공을 하려고 싸울 테니까 그걸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웃음). 제가 생각하기에 연출은 ‘대표 관객’인 것 같아요. 공연을 보러 올 관객을 대신해서 미리 드라마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지요.

연극반 출신의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신입생이었을 때는 배우를 하다가 선배가 되고 나서 연출을 하게 됐죠. 졸업반이 되면 다들 학교 밖으로 공부하러 나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연극에 미쳐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출을 맡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됐고, 연출이라는 일이 가진 매력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사실 연출가는 좀 외로운 존재에요. 연출가는 관객들이 오기 전에 혼자 텅 빈 객석에 앉아서 관객이 느낄 것들을 미리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서로 교류하며 힘을 얻지만, 연출은 혼자 느끼고 생각하고 책임질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외로워요. 그런 외로움이 부담스러워질 때는 연기를 하거나 글을 쓰면서 그런 부담을 좀 덜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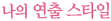
저는 숲 속에 머리를 박고 이끼 안을 바라보는 연출이에요. 대부분의 연출가는 숲 전체를 조망하면서 각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할까를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기보다는 객석에 앉아서 배우들이 제대로 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등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연출답지 않은 연출이에요. 어쩌면 대표 관객이면서 대표 관객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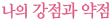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객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위대한 연출가로 이름이 나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연출은 아닌 것 같네요(웃음). 장점도 비리비리하고 단점도 딱히 분명하지 않은. 만약 그걸 잘 알았다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고쳐서 위대한 연출가가 되어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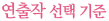
배우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출가 역시 프로덕션의 선택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배우가 아주 유명해지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다들 어렵기 때문에 프로덕션에서 제안하는 역할이 자신과 너무 안 맞지만 않으면 보통 출연을 하거든요. 연출가도 마찬가지라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돈이 많은 프로덕션과 함께 공연을 한다면 작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캐스팅을 마음대로 해서 큰 무대를 만들 수 있으니 하게 되고, 돈이 없는 프로덕션과 하더라도 작품이 좋고 마음 맞는 배우가 있으면 또 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을 하든 일단 ‘재미있는 작품’이 좋아요. 일반적인 것을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들이 재미있고, 그런 공연을 하고 싶죠.


제 작품은 지금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떤 날은 이 작품이 좋고 어떤 날은 저 작품이 좋아서 하나를 꼽기가 어렵네요. 제 작품이 아닌 것 중에선 꼽을 수 있어요. 연극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죠. 예전 어느 날 국립극장에서 <피고지고 피고지고>라는 연극을 봤어요. 맨 앞자리에서 공연을 보는데 문득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내가 정신을 깜박 놓으면 저 무대에 올라 가서 소리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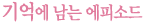
마침 요즘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내가 왜 연극을 하고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돌아보면 작품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네요. 연극 <양덕원 이야기>를 했을 때인데, 극중 라면 끓여먹는 장면이 나와요. 배우들과 연습실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라면만 먹기는 그러니까 술을 좀 사오자’ 해서 소주를 한 병 마시고, 나중엔 결국 스무 병을 다 마시고 술에 취해서 연습을 중단했죠(웃음). 또 첫 연출을 할 때 포스터를 찍을 돈이 없어서 직접 실크 스크린으로 밤새 포스터를 찍어내서 한 장 한 장 빨랫줄에 걸어서 말린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 살 냄새를 풍기면서 같이 고민하고 부대끼고 술을 마셨던 기억들이 가장 소중하고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억 때문에 연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작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함께 놀고 호흡할 수 있어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연극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공연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 수만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에요(웃음). 내가 공연을 한다고 할 때 배우들이 같이 하고 싶어하고, 관객들이 보러 오고 싶어하는 그런 연출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나와 작품을 하는 배우들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욕은 좀 먹어도 이 연출이랑 하면 뭔가 배울 게 있어, 돌아서면 재미가 있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배우들이 또 오지 않겠어요. 배우가 찾아주는 연출, 관객들이 보러 오는 연출이 되어야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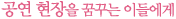
일단 뭐든 해야 해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냥 ‘꿈꾼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지금 만들어야 해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따라준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연극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지붕 위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면 되요. 그게 프로인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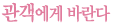
관객에게 뭘 바라겠어요. 관객은 어느 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혹은 친구 생일이라서, 혹은 영화를 볼지 연극을 볼지 고민하다가 연극을 선택하고 보러 오는 거에요. 그 선택은 온전히 관객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니까 관객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대신 관객이 극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이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재미나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어야겠죠. ‘좀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연을 본 관객들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정리: 박인아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iapark@interpark.com)
사진: 차이무, 플레이디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