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신

- 출생연도
- 최종학력
- 최근작품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다. 배우와 공동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훌륭한 연출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웃음) 물론 교통정리가 공연 제작에 중요한 일임엔 분명하다.

영화 미술 조감독 일을 시작했는데 그 무렵 블랙텐트라는 극단의 연구생으로 있기도 했다. 그곳을 졸업하면서 극단 대표가 입단을 권했고, 그렇게 들어간 극단에서 2년 되던 해 극단 내 새로운 작가 발굴 사업을 통해 극작가로 발탁되어 첫 작품을 쓰게 되었다. 그 작품의 연출가는 원래 따로 있었는데 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연습실이 너무 추워서(웃음) 결국엔 그 연출가가 작품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극단 대표가 자신이 연출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다소 '올드'하다는 배우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새 작품은 새로운 사람이 연출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품을 쓴 내가 연출까지 권유받게 되었다. 그 작품이 <사랑하는 메디아>이다.
처음 연출을 할 때는 작가로서의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배우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 달라'는 식의 요구가 많았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배우가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일 때도 있었고, 조금 더 지나니 작가와 연출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본을 볼 때나 대본을 무대에 올릴 때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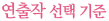
보통 술 한잔 하면서, 해 봐라,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다. (웃음) 올 1월 일본에서 한 공연은 극단 대표로 있던 선생님의 추모 공연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작품을 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공연 주최자를 만나면서, "선생님의 제자이니 네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연출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나중에 할 때도 있지만, 일단 내가 연출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출연하겠다는 배우들이 몰린 상태이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내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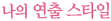
나는 스타일이 없다. (웃음) 작품을 하며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공동작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너무 이상한 점은 지적한다.
작품에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려 하고, 발견된 공통점을 무대 위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지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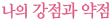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슬픈 작품이라도 웃을 수 있게 만든다. 나쁜 점은 그 웃음이 짓궂다는 것이고. (웃음)
내 작품은 궁극적으로 보면 비극이다. <야끼니꾸 드래곤>도 결국엔 가족들이 흩어지고, 한국에서 아직 공연되지 않은 <이발소와 진달래>라는 작품은 탄광 안 이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평행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비극일지도 모를 일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희극으로 보일 때가 있다. 사물을 보는 시각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 부모님이 재일교포로 살며 고철상을 운영하셨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런 상황들을 보며 자란 작가가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특이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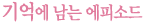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웃음) 한 번은 배우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내부 장기를 찌를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공연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배우의 움직임을 바꿔서 매 공연을 긴장 속에 했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지금부터 하는 작품이 내 인생의 작품이다."라고 말한다.(웃음) 내가 쓰고 연출한 작품이 아닌 것 중에서는 루치노 비스콘티의 영화 <젊은이들>(한국 제목 <로코와 그의 형제들>)을 꼽을 수 있겠다. 한 가난한 이탈리아 집안의 다섯 형제가 주인공인데, 이들 형제의 이야기가 각자 옴니버스식으로 나온다. 나 역시 형제가 다섯이라 공감이 많이 되고 그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인어전설>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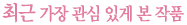
NT Live <프랑켄슈타인>이 재밌었다.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웃음) 처음에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긴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의 육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적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한국 배우들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무대 미술도 아주 대단했고 종합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다. 두 배우가 무대 뒤로 나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다.

딱히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주어진 것을 묵묵히 해 나가는 스타일이고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 사회 비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작품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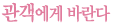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관객들의 자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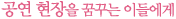
언제나 자신이 갈 길은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찾아갈 것이다. (웃음) 연극에 30년간 몸 담고 있었고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정리: 황선아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suna1@interpark.com)
사진: 플레이디비 DB
댓글
댓글1
-
irtu**님 2015.03.10
벌써 했는데요. 프랑켄슈타인...2014년 약간 각색되었지만 거의 그대로. 박해수 이율배우가...조광화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