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영

- 출생연도
- 최종학력연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 석사
- 최근작품

중심을 찾아가는, 조율사
종합예술인 뮤지컬에는 연출, 극작, 음악, 안무, 연기 등 정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감독은 대본, 연출, 안무가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음악에 캐릭터를 녹여낼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음악감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의 입장과 대본에 녹아 드는 음악을 찾으려는 음악감독의 역할, 그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 또한 음악감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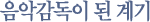
<하드락 카페> 작곡가 겸 음악감독
2004년 서울시립뮤지컬단의 <하드락 카페>에서 작곡가 겸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사실, 시작은 참 얼렁뚱땅 이었어요. 원래 있던 음악감독의 사정으로 제가 급하게 투입이 됐으니까요. 시작은 <하드락 카페> 음악감독이었는데, “이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다른 음악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작곡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렇게 작곡가 겸 음악감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작업 시간이 한 달 정도였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정말 사활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작업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웃음). 다행스럽게도 노력했던 만큼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지금까지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 활동 - 전문화, 분업화
음악감독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반주, 보컬 트레이너 역할, 음악과 드라마의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이 있지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전문 트레이너, 전문 반주자 등이 모인 팀의 장점을 살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문 레스토랑주방에 가면 면을 삶는 사람, 물을 조절하는 사람, 불 세기를 조절하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작업을 할 때도 분업화된 조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작곡을 할 때도 각자 테마에 맞는 노래를 써오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의 색깔을 내는 작업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습 초반에는 배우들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드라마가 같이 가야 하는 연습 중반부터는 ‘작가와 연출이 원하는 것을 잡아내고 있는가’, ‘캐릭터에 맞게 부르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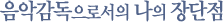
작곡을 전공 하다 보니, 배우가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우에게 맞지 않는 음역대의 노래는 음을 고쳐주기도 하고, 반주로 감싸주면서 배우들이 역할에 맞게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게 장점 아닌가 싶어요. 단점은, 우기고 가야 하는 음악이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그 지점을 비껴갈 때도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작곡가, 음악감독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카페> - ‘돌아갈 수 없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작품이라 그런지 <하드락 카페>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지금 들어보면 촌스럽고, 느려서 창피하지만(웃음) ‘돌아갈 수 없어’라는 넘버는 저를 지탱해주는 노래죠. 이 곡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도 꾸준히 들어왔고, 지금 들어보면 어설픈 노래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열정으로 가지고 쓴 곡이라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지컬 넘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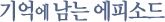
예전에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작업물을 보고 “여기 좀 고쳐주시죠” 하면 절대 안 고쳤어요. “한 번 고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날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의견을 내는 건데(웃음). 한 번은, 유명한 모 배우가 제 곡을 연습해왔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음도 불편하고. 저한테 “멜로디가 유치한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트롯 같이 부르니까 그렇지 아냐”고 맞받아쳤어요.
작품을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배우도 울고, 저도 다른 곳 가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그 배우는 “트롯 같이 노래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배우였어요. 서로 건드린 거죠. 지금 같으면 “유치해도 불러주세요” 하면서 좀 노련하게 했을 텐데, 그 때는 이상하다는 말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배우랑 친해졌어요(웃음).

라이브 공연 때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죠.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는 배우들이 머리에 차고 있던 쪽이 날아오기도 하고, <금발이 너무해> 때에는 흥분한 나머지 지휘봉을 날리기도 했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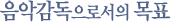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율도 잘했고, 음악이 작품에 잘 묻어난 작품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음악감독 역할 참 잘했다”를 듣는 게 목표에요.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야 할 때 음악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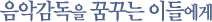
정리 : 강윤희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kangjuck@interpa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