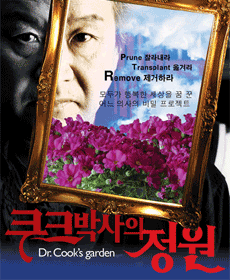<쿠크 박사의 정원> 악(惡)이 주는 위안

정원은 그 자체로 인공성을 띈다. 생활 외부 공간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처리한 이 곳에서 키가 다른 풀이나 벌레 먹은 꽃은 가위에 의해 잘려지기 마련이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죄가 된 풀이나, 향기가 더욱 그윽해 벌레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꽃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공통점을 무기로 살아남은 대다수는 자신들의 성질을 평화롭게 유지한 셈이 되니, 가위를 든 정원사의 손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사유하며 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특권. 이들은 1과 1이 합해져 2가 된다는 사칙연산 말고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善)과 악(惡) 등과 같은 기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정답을 만들고 실천하는 위험한 행동을 정의의 이름 아래 놓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쿠크 박사가 적어놓은 병원 차트의 R을 통해 이 마을의 ‘완벽한 온전성’에 대한 의문은 시작된다. 이 글자가 적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죽어 있거나, 조만간 세상을 뜨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큰 병원보다도 많은 극약들, R자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쿠크 박사의 사망진단 아래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쿠크 박사를 겉과 속이 다른 극악한 살인자로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이들이 범죄자나 불구자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자신의 삶이 타인의 짐이 될 수 있는 경우였다면 이야기는 달리지는가?
1979년 국내 처음 선보인 연극 <쿠크 박사의 정원>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질문한다. 공공을 위한 선이 절대 선인가? 그렇다면 선을 위한 악의 실천 역시 선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절대 고귀한 ‘인간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가?
한국 연극계 큰 기둥이며 작품 번역을 맡은 구히서의 칠순 기념 헌정공연이자 서울연극제 참가작인 연극 <쿠크 박사의 정원>은 탄탄한 텍스트와 안정된 무대로 좀처럼 그 맛을 내기 힘든 서스펜스의 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초연 당시 쿠크 박사 역을 맡았던 배우 김인태의 아들 김수현이 이번 공연에서는 의문을 추적하는 젊은 의사 짐 역으로 열연한다. 시종일관 힘이 들어간 격양된 간호사의 음성에 젊은 관객들은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선과 악을 넘나드는 야릇한 미소의 베테랑 배우 이호재의 힘이 공연을 압도한다. 정원을 다듬는 쿠크 박사의 가위질에 충분히 놀아나도 좋을 만큼.
글 : 황선아 기자(인터파크ENT suna1@interpark.com)
[ⓒ플레이DB m.playd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