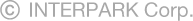[인터뷰] “‘솔롱고’처럼 부당한 일도 겪었죠” 배우 김경수 인터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작품이 뮤지컬 ‘빨래’다. 작품은 09년부터 약 1,300회의 공연을 펼쳤고, 장기간동안 변함없이 사랑받았다.
이번 13차 프로덕션에서 ‘솔롱고’ 역할을 맡은 배우 김경수를 만났다. 배우 김경수는 예전부터 이 작품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를 ‘빨래에 대한 열망’이라고 표현했다. 두 번의 오디션에서 낙방하고 우여곡절 끝에 13차 프로덕션에 합류했다. 뮤지컬 ‘빨래’ 공연장에서는 배우로서 공부하러 갔다가도 한 사람의 관객이 돼버린다는 배우 김경수에게 물었다.
- 이주노동자 몽골인 ‘솔롱고’ 역할에서 어눌한 한국말이 인상적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골인 같더라.(웃음) 몽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
몽골타운을 갔었다. 광희동에 있는 정도의 건물에 몽골 관련 음식점, 상점이 모여 있다. 팀 배우들과 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갔었다. 좀 무서웠다. 몽골사람들만의 공간이라 이방인 취급당하는 느낌이더라. 한국 땅인데 말이다.(웃음)
혼자 찾아가서 몽골 식당에서 양고기 국이라는 것을 먹었다. 먹고 토하는 줄 알았다. 너무 느끼했다. 그래도 몽골인들의 시선 때문에 눈치 보여서 꾸역꾸역 다 먹고 왔다.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수퍼마켓가서 괜히 한 번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어처넌’(오천 원) 하는 어눌한 한국말이 들려온다. 몽골타운에 오래 머물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웃음)
- 그곳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겠다. 한국말을 하는 몽골인을 관찰하기 위한 다른 루트는 없었나?
인터뷰 영상을 있는 대로 다 뒤져봤다. 회사에 소장하고 있는 게 없어서 혼자 열심히 찾았다. 대부분은 몽골어를 쓰고 한국어 자막이 나오는데, 정말 가끔 한국말로 하는 영상이 하나씩 있더라.

-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다. 작품을 하면서 많이 공감했을 듯하다.
물론이다. 넘버 중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하면 참 와 닿는다. 물론 힘든 일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 서럽지는 않다. 대신 공연에서 가사들이 많이 녹아든다. 극 중 나영이가 ‘서울살이 몇 년, 몇 번째 이사’ 하는 노래를 하면 공감이 간다. 나도 이사를 8번을 했다. 돈에 쫓겨서 하기도 했다.
- 서울에 혼자 올라와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내가 돈에 예민하다.(웃음)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공연하면서 꽤 큰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믿었던 사람들이라 공연 수당이 밀려도 회사가 힘들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 얘는 아무 말 안 하네?’라며 끝까지 안주는 거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
공연이 끝나고 수당을 정리해 달라고 회사에 전화했다. 그래도 안주더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래서 대표를 찾아가 큰돈을 한 번에 줄 수 없으니 나눠서 매달 조금씩 달라고 지불각서를 썼다. 대표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써주더라. 나 말고도 같은 상황의 배우가 너무 많았던 거다. 두어 달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더라. 결국 못 받았다.
- 공장에서 월급 못 받고 쫓겨난 ‘솔롱고’와 비슷한 상황이었겠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을 1년밖에 못한다.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내건다. 약점을 잡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만드는 거다. 솔롱고도 이직을 5년 동안 5번을 했다.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단이 있는 친구다.
이런 솔롱고의 전사는 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연 제작사 대표가 다른 공연에 추천해줄 테니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더라. 정말 ‘어이없음’이었다. 작품으로 배우들을 옭아맨다.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는 식이다. 사실 배우들이 좋은 작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좋고 큰 작품일수록 그런 제안을 받으면 배우들은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난 그 회사랑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거절했다.
-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나.
그때는 다른 작품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서울에 올라온 직후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축가도 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일했다. 축가는 내가 서울에서 버틸 수 있게 한 아르바이트다. 레스토랑 알바 등 많이 해봤는데 시간대비 가장 효율적이다. 대신 그건 ‘철장사’라서.(웃음)

- 2002년도에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더라.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 아닌가?
대학교 다닐 때 토목과였다. 취미로 통기타 동아리를 들어가서 음악을 접하게 됐다. 대학가요제를 계기로 기획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다. 하지만 그때는 스카우트 제의가 무서운 일인 줄 알았다. 군대 가기 직전이라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진했던 거다. 입대하고 후회도 했었다. 그래서 휴가 나올 때마다 ‘음악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1년 안에 실용음악과에 합격했고, 바로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했다. 그러다 06년에 뮤지컬을 처음 보고 완전히 빠졌다. 뮤지컬의 형식은 신세계였다. 노래를 깊이 있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가요나 팝송을 부를 때는 작곡, 작사자가 담은 의미들을 알고 부른 적이 없었다.
- 언젠가 뮤지션으로 활동할 계획은 없나?
있다. 음악을 좋아해 혼자서 작곡 작업을 하고 있다. 음악적으로 통하는 형들이 생겨서 음악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뮤지션이란 말은 너무 멀지만, 음악의 끈은 놓지 않을 거다.
- 뮤지컬 ‘빨래’의 매력은?
제목을 어떻게 ‘빨래’로 할 수 있을까. 너무 평범한 제목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작품이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 ‘빨래’의 매력이다. ‘평범함 속의 특별함’ 말이다. 배우, 무대세트, 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보인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다른 등장인물들의 드라마가 있기에 특별한 작품이다.
이소연 기자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