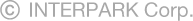<장석조네 사람들> 별의별 일로 정겹고 재미진 사람들 이야기
작성일2009.05.19
조회수9,397
 이 작품, 참 배짱 좋다. 마우스로 클릭한 컴퓨터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변하기까지 채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러닝 타임 2시간의 뮤지컬도 50분 공연 후 인터미션을 갖는 공연들이 즐비한 이때, 현란한 볼거리와 사운드도 없는 연극으로 3시간의 러닝타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 작품, 참 배짱 좋다. 마우스로 클릭한 컴퓨터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변하기까지 채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러닝 타임 2시간의 뮤지컬도 50분 공연 후 인터미션을 갖는 공연들이 즐비한 이때, 현란한 볼거리와 사운드도 없는 연극으로 3시간의 러닝타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이 공연을 찾은 관객들이다. 연극 <장석조네 사람들>을 찾은 관객들에게 3시간은 쉽게 채감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숫자로 이내 곧 머릿속에서 날아가버리고 만다. 그러고 보니, 배짱이 아니라 까닭 있는 자신감이 두둑한 작품이었다.
올 2월 극단 드림플레이의 워크숍 공연으로 첫 선을 보였던 연극 <장석조네 사람들>이 본 무대에 오르고 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뜬 김소진의 동명 소설 ‘장석조네 사람들’에서 시작된 이 무대에는 길음동과 미아리 주변 기찻길 옆, 장석조네 집에 세 들어 사는 아홉 가구의 이야기들이 흐른다. 각기 떠나온 길이 다른 이들의 삶은 거칠고 억세지만 푸근한 정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관객들은 희곡과 배우가 공연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며 극적 재미와 완성도에 기여하는 지, 그 상당한 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글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입말’이 가득했던 소설의 미덕이 그대로 작품에서 살아난다. 팔도를 넘나드는 구수한 사투리와 더불어, 걸쭉한 입담에 실린 해학은 1970년대 도시 빈민들의 남루한 삶을 흥겹고 또 가슴 저리게 비춰낸다.

또한 8편의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장석조네 사람들>에서는 조연이 없다. 끝 방에 사는 양은 장수 최씨는 옆집 박씨 형님의 도망간 아내를 몰래 찾아 오고는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이웃사촌도 아니라”며 스리슬쩍 넘어가 준다. 사근사근한 아내에 괜한 오해를 품는 겐짱 박씨나, 모자란 딸과 아픈 아내도 제쳐놓고 돼지꿈에 또 노름판으로 뛰어든 양씨, 파란 눈, 노란 머리의 아들을 낳아 놓고는 검은 피부의 사내와 결혼하겠다는 딸로 날로 속을 썩는 함경도 아즈망 등 등장 인물 모두가 주인공이다.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인 것처럼 저마다의 개성으로 살아 펄떡이는 캐릭터들의 향연은 이 작품을 즐기는 또 하나의 선물일 것이다.
스물 아홉 가지의 배역을 넉살 넘치게 연기하는 14명의 극단 드림플레이 배우들을 놓치지 말자. 그 중 똥지게를 지고 다니는 광수애비와 거인증을 앓는 비운의 육손이 역을 맡은 이갑선은 더욱 돋보인다. 흉터로 뒤덥힌 얼굴로 기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세상을 살아가는 서글픈 육손이에서, 대를 이어 똥을 지며 ‘별은 똥이다’를 소박하고 절실한 철학으로 풀어내는 광수애비를 자연스레 오고 가며 그는 관객 모두에게 매끄럽고도 또렷한 인상을 깊게 심어준다. 가장 최근 출연작인 연극 <맹목>에서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살인을 마다 않던 위험하고 날카로운 우등생 역에 섰던 그를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더욱 새롭게 다가올 모습이다.
오리 역으로 유일하게 동물 역할을 맡은 김하리에게서도 쉬이 눈을 뗄 수 없다. ‘반짝이는 것을 삼킨 듯’한 까닭에 사람들의 극진한 보호와 암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오리를 비롯하여, 지능도 모자라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효심만은 넘치는 양씨의 어린 딸, 먹성 좋은 갑석아범의 딸, 또 혼혈아 옥자의 아들 등 자식 역도 도맡아 열연하는 그의 변신은 신선하고도 놀랍다.
작은 소극장 무대 벽에 분필로 그려 넣은 듯한 그림들은 뒷방 문, 옆집 문턱, 연탄집게, 창호지 덧바른 창문 등, 수 많은 소품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소박한 작품의 분위기와 소박한 극장에서 인물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재치가 십분 발휘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일궈내는 담담하고 담백한 인간미에 관객들의 감동은 소박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글: 황선아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suna1@interpark.com)
[ⓒ플레이DB m.playd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